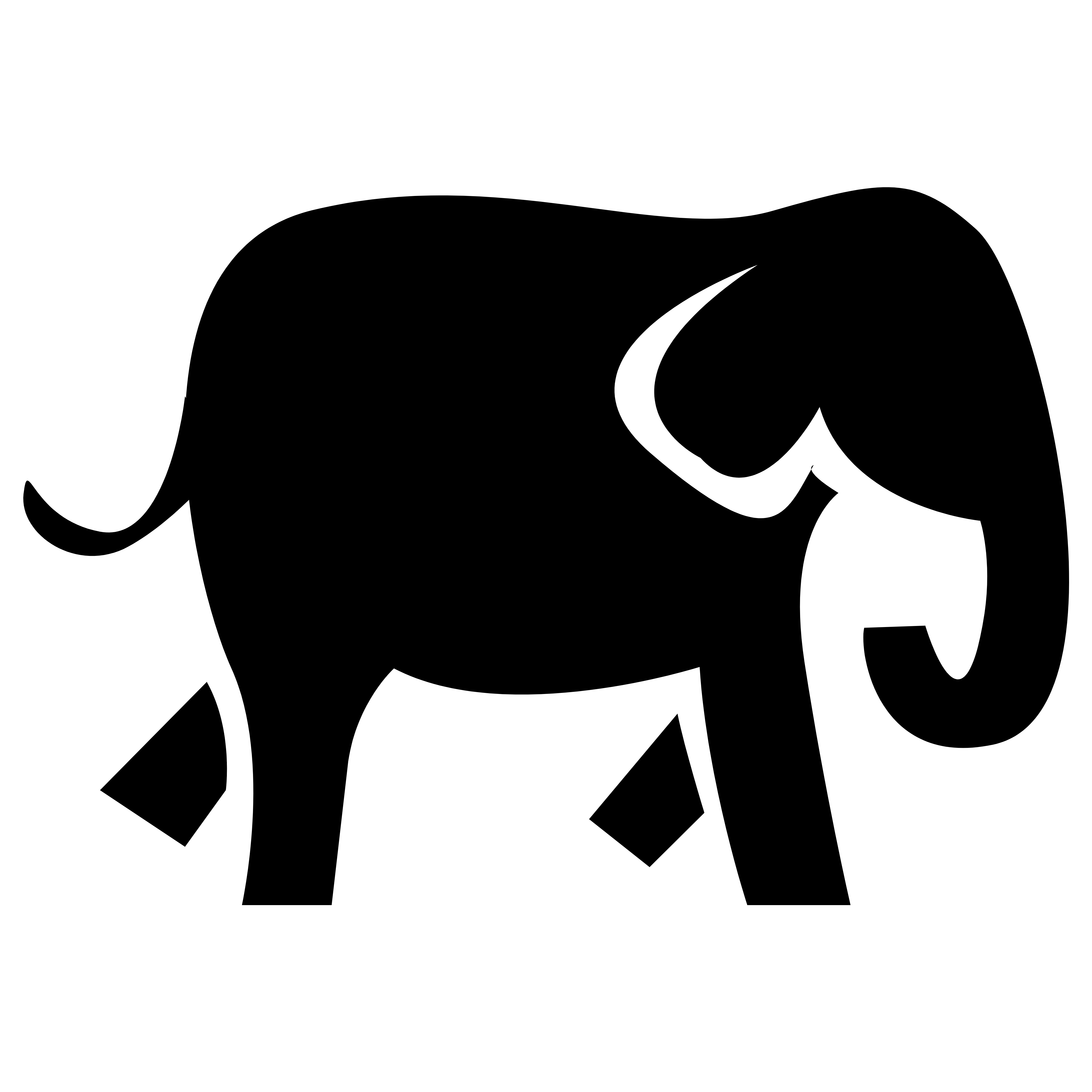목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는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라는 명확한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막대한 외부효과(Externality), 특히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감정적인 찬반 논쟁을 넘어, 해당 시위 방식이 유발하는 직접적·간접적 경제 비용을 분석하고, 시위 전략의 경제적 합리성을 평가합니다.

1. 직접적 경제 손실: 출근길 지연의 기회비용 계량화
시위로 인한 가장 직접적인 경제 손실은 수만 명의 시민들이 겪는 '시간 손실'을 '기회비용'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9월 29일 시위로 약 36분의 운행 지연이 발생한 것을 기준으로, 최소한의 경제적 손실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기회비용 추산 (최소치)
이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 기업의 업무 차질, 추가 교통비용(택시 등)을 제외한 최소한의 직접 손실액입니다.
- 기준: 2025년 서울시 시간당 평균 임금 약 18,000원 (분당 300원)
- 대상: 1호선 열차 1편성 정원 약 1,600명, 영향 받은 열차 10대 가정
- 계산: 300(원/분) * 1,600(명/편성) * 10(편성) * 36(분) = 1억 7,280만원

2. 간접적 경제 손실: 사회적 신뢰자본의 침식
직접적인 손실보다 더 심각한 것은 계량화하기 어려운 무형의 사회적 비용입니다.
- 공공 인프라 신뢰도 하락: '지하철은 정시에 도착한다'는 사회적 약속, 즉 '정시성'이라는 공공재의 가치가 훼손됩니다. 이는 시민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예비 시간을 두게 만들어, 사회 전체의 시간 효율성을 저하시킵니다.
- 갈등 해결 비용 증가: 시위 방식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를 중재하고 해결하기 위한 행정적, 정치적 비용이 증가합니다. 경찰력 동원, 언론의 과도한 보도 경쟁 등도 모두 사회적 비용에 해당합니다.
- '대의'의 가치 하락: 시위 방식에 대한 반감이 커질수록, '장애인 인권 개선'이라는 본래의 대의명분마저 대중의 지지를 잃게 될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이는 해당 단체의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경제적 손실일 수 있습니다.

3. 시위 방식의 경제적 합리성 분석
전장연의 시위 전략은 경제학의 '죄수의 딜레마'와 유사한 측면을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언론의 주목을 받고 의제를 공론화하는 '이익'을 얻지만, 장기적으로는 시민들의 반감이라는 '손실'을 누적시켜 공멸하는 게임이 될 수 있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 합리적인 전략입니다."
전장연의 시위 방식은 '최소의 비용(소수 인원의 참여)'으로 '최대의 사회적 파장(출근길 마비)'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파장이 '긍정적 관심'이 아닌 '부정적 반감'으로 전환될 경우, 정책 결정에 필요한 대중적 지지 기반을 상실하게 되어 최종 목표 달성에는 오히려 비합리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4. 결론: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한 제언
전장연 시위 사태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 주장과 다수 시민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현재의 시위 방식은 단기적 효과에 비해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경제적 손실, 신뢰자본 침식)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모델에 가깝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장애인 권리 예산을 현실화하는 노력과 동시에, 시민들의 일상을 볼모로 잡지 않는 보다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소통 방식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